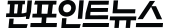100조원.
올해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나란히 공약으로 내건 인공지능(AI) 산업 투자 규모다. 두 후보 모두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데이터센터 건설, 청년 인재 양성 등 구체적인 계획을 공약집에 수 줄씩 늘어놓으며 'AI 세계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약속했다. 그러나 정교해 보이는 청사진 속에 정작 눈에 띄지 않는 것이 있다. 전력, 즉 이 거대한 산업을 실제로 움직일 '동력'이다.
AI 산업은 '전기 먹는 하마'라고 불릴 만큼 많은 전기 에너지를 소모한다. 대규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대형 서버, 냉각 시스템 등의 장비들이 필수적으로 동원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100단어 길이의 이메일 하나를 AI로 생성하는 데 약 0.14kWh(킬로와트시)의 전력이 소모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이는 LED 전구 14개를 1시간 동안 켤 수 있는 전력량으로, AI가 우리 일상에 깊숙이 들어올수록 전력 수요가 얼마나 가파르게 증가할지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이 내놓은 에너지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석탄화력을 2040년까지 폐쇄하고, 탄소중립 목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중심 체제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는 "활용은 하되, 확대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안전성과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우려를 표했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는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뒷받침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날씨와 시간에 따라 출력이 불안정하다는 특성상, 고정적이고 막대한 전력을 요구하는 AI 산업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여기에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보다 세 배 가까이 비싸다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1㎾h(킬로와트시)당 전력 생산 단가는 원자력이 50~60원 수준인 반면, 재생에너지는 270원에 달한다.
이에 반해 김문수 후보는 원자력 확대를 핵심적인 에너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전체 발전량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중을 60%까지 끌어올리고, 이를 통해 전기요금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윤석열 정부 시절 계획된 대형 원전 6기의 건설을 재추진하고, 소형모듈원전(SMR) 상용화 시점을 앞당겨 안정적인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로드맵도 함께 내놨다.
그러나 원전 건설은 첫 삽을 뜨는 순간부터 상업 가동까지 통상 10년, 길게는 25년 가까이 걸리는 장기 프로젝트다. 지금처럼 수년 내 폭증할 것이 확실시되는 AI 산업의 전력 수요를 당장 충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30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는 SMR도 사정은 비슷하다. 아직 기술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어, 아무리 자본을 쏟아부어 연구개발(R&D)에 속도를 낸다고 해도 눈에 띄는 성과를 당장 기대하긴 힘들다. 게다가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송전망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 역시 밝히지 않았다.
결국 문제는 돈이 아니라 전기다. 아무리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 없이 AI 산업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다. 세계 3대 AI 강국이라는 장밋빛 꿈을 실현하려면, GPU 확보나 데이터센터 구축보다 먼저 전력 인프라에 대한 현실적인 해법이 선행돼야 한다.
'원전이냐, 재생에너지냐'를 두고 이념적으로 소모적인 논쟁을 벌일 시간이 없다. 이제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어떻게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계획과 실행 로드맵이 필요하다. 그런 준비 없이 외치는 AI 전략은 결국 이름만 거창한 껍데기에 불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