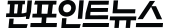전세사기 급증으로 재무구조가 악화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결국 보증료 개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현실화'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정부와 HUG의 안일한 대처가 만든 결과를 임차인의 돈으로 메우게 된 셈이다.
이번 개편안은 위험도가 높은 전세 계약일수록 보증료율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위험이 낮은 계약에는 보증료를 낮춘다는 것이 골자다. 집값 대비 전셋값이 과도하게 높을 경우 보증금 미반환 사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보증료를 더 받겠다는 논리다.
언뜻 합리적인 방안으로 비칠 수 있지만, 보증료 인상이 불가피해진 일부 임차인들의 입장에서는 '날벼락'이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보증료가 가장 많이 상승하게 되는 대상은 비(非)아파트 거주자로, 최대 37%까지 오르게 된다. 예컨대 보증금 5억1000만원짜리 빌라에 거주하는 세입자는 기존 78만5400원에서 107만6100원으로 보증료 부담이 급증하게 된다.
보증료 부담이 임대인이 아닌 오롯이 임차인에게만 전가된다는 점도 문제다. 임대 사업자가 아닌 일반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은 의무가 아니다. 따라서 보증료가 인상될 경우 임대인이 보증보험 가입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고, 임차인은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어 무방비 상태로 전세사기의 위험을 떠안을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서는 HUG가 고질적인 재무 위기 해소 방안을 임차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 없이 보증료 인상이라는 손쉬운 해법만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HUG는 2023년 기준 4조원에 육박하는 영업손실을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몇 년 전부터 전세 사기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했지만, 정부와 HUG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다.
전세보증 사고율은 2021년 1.9%에서 2023년 8.1%까지 치솟았고, '빌라왕' 등 대규모 전세사기가 기승을 부리면서 보증금 미반환 사고도 급증했다. 결국 HUG가 집주인 대신 임차인에게 갚아준 대위변제액은 지난해 4조원에 육박했고, 낮은 회수율로 인해 손실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정부 역시 2021년부터 4년간 5조원이 넘는 혈세를 HUG에 쏟아부으며 재정 지원을 해 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는 못했다. 앞서 HUG는 7000억원의 주택도시기금 출자에 이어 지난해 한국도로공사 주식 4조원을 현물 출자받았다.
이번 개편안은 당장 오는 3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앞서 HUG는 개편 이유에 대해 '보증 사고율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하지만 이는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킬 뿐, 구조적인 개선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상황에서 정부와 HUG가 진정으로 취해야 할 조치는 보증료 인상과 같은 미봉책이 아니라 전세 시장의 제도적 허점 보완과 임차인 보호다.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실거래가 검증 강화나 임대인의 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임차인들만이 피해를 입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