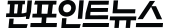오픈마켓에 뛰어든 후계농업인, 시장 트렌드 파악키 위한 전략...의견 엇갈려
지역 농촌사회에 '온라인 유통' 열풍이 거세다. 인터넷 중개몰을 통해 농산물을 유통하는 협회가 생기는가 하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자신의 농산물을 알리는 농업인까지 등장하고 있다.
4일 농업계에 따르면 신지식농업인 협회는 일정 기준치 이상의 당도를 유지한 농가에 한해 온라인 중개 업소 3곳의 유통 판로를 지원하고 있다. 또, 유명 SNS 채널인 인스타그램에서는 #농산물 직판, #농산물 유통 등 농산물 온라인 유통 관련 게시글이 수 만건에 달할 정도다.
다만, 온라인 유통은 '안정적인 수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눈길을 끈다. 온라인 중개업소가 제시하는 농산물 기준치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에 비료 사용 등 생산비가 증대되고, 농산물 도매시장 등 오프라인 유통과는 달리 일정한 수요 그래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서다.
그럼에도 지역 농부들이 온라인 유통에 뛰어 든 이유는 무엇일까. 온라인 유통 비중이 높은 창업·후계농(후계농업경영인 줄임)들은 생존을 위한 새로운 도전이라고 입을 모은다.
창업·후계농의 깊은 한숨..."수요보다 공급량 더 많아"
전남 목포시 용당동에서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는 후계농 이선익(44) 씨. 그는 온라인 유통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정부의 창업농 육성 지원 정책에 따라 농업에 뛰어든 경쟁업체가 늘어나면서 판로 확대가 불가피해졌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이씨는 "부모 세대로부터 농업을 이어받은 후계농들에게 온라인 유통 진입 계기를 묻는다면 답은 정해져 있다"며 "기존 오프라인 유통만으로는 수익이 보장되지 않고 있다. 농산물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이씨에 따르면 귀농을 택하는 청년 농부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농산물 공급량은 이미 포화상태다. 가격 협상을 맺을 때에도 "이 가격이 아니면 안 사요. (이 가격에) 물건을 팔 업체는 많아요"라는 답변이 곧잘 돌아오곤 한다. 이는 불과 3년 전까지 없던 보기 드문 현상이라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그는 "지역 농산물시장을 방문해 농산물 가격을 확인해보시기 바란다. 판매가는 변함이 없음에도 3년 전 대비 도매가는 작물 별 평균 15% 남짓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농산물 도매시장의 눈치를 살피는 것보다 온라인 유통을 통한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낫다는 말이 후계농들 사이에서 떠돌 정도"라며 "즉, 후계농들의 온라인 마케팅은 이윤 증대의 목적보다는 최소 생계를 유지하려는 몸부림과도 같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현상은 창업농 지원 사업의 대표적인 부작용이라는 비관적인 주장도 나온다. 올해까지 총 3200여 명의 청년농들이 지역 농촌사회로 유입되고 있는데 농산물 가격 안정, 최소가 보장 등의 조치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후계농 김모 씨는 "우리나라 농산업의 규모를 키우고, 지탱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지지하면서도 한 편으론 아쉬움이 남는다"며 "농산물 공급량이 이전보다 늘고 있기 때문에 판로 확충 부분에서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농산물 최소가 보장, 농산물 수요 증진을 위한 지역 마케팅 등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온라인 시장 잡아라"...新 판로로 부상한 '온라인 장터'
온라인 유통 열풍은 공급량 증진의 문제보다, '농산물 유통구조 변화'에 있다는 또 다른 해석도 나온다. 오프라인 시장의 규모가 매해 축소되고 있는 반면, 온라인 시장은 성장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발을 맞춘 결과라는 것이 후계농 이영민(43) 씨의 설명이다.
전남 나주시에서 나주배를 재배하고 있는 이씨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와 SNS를 통해 온라인 마케팅에 주력하고 있다"면서도 "온라인 유통은 단순 오프라인 유통과는 달리 자신의 제품을 알리고, 브랜드밍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매출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는 "온라인 마케팅은 농산물 공급량 증가의 문제보다는 후계농들이 유통 트렌드 변화에 민감히 대응하고 있다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창업농 지원책이 미비한 해외에서도 소셜네트워크를 통한 농산물 마케팅이 활개를 띄고 있다는 점이 이를 증명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과 함께 WTO(세계무역기구) 농업 후진국으로 분류됐던 중국 유명 SNS 웨이보에서는 农产品流通(농산물유통), 农产品(농산물) 등 관련 게시글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농민 지원 수당이 한국보다 적은 멕시코 역시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전문 포털사이트가 수백 개에 달할 정도다.
이씨는 "이전까지 농업은 하나의 경영체라는 느낌보다는 이전의 방식을 고수하는 특수업종의 느낌이 강했다"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방식으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를 따라 잡을 수 없다. 기존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청년농들이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면서 온라인 유통이 부상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