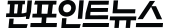고순도 폴리실리콘 생산 대폭 늘려…반도체 소재 국산화 바람에 기회 잡았다

[핀포인트뉴스=박남철 기자] 폴리실리콘 가격 하락에 고민하던 OCI가 한・일 무역 분쟁에 또 한 번의 기회를 잡게 됐다. 이는 일본이 반도체 관련 소재 수출을 제재함에 따라 '소재 국산화'가 화두로 떠오르며 OCI의 고순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에서다.
1일 소재업계에 따르면 최근 OCI는 주종인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함께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이는 이달 초 일본이 반도체용 소재 수출에 제동을 걸며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주목 받고 있는데 따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반도체용 고순도 폴리실리콘은 반도체 공정의 핵심 원료인 웨이퍼의 원재료다. 수 백개의 공정을 거친 웨이퍼로 반도체 집적회로(IC)가 만들어진다.
OCI는 한일 간 무역 갈등에 향후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국산화에 힘을 싣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이를 미래 먹거리로 삼겠다는 전략도 엿보인다.
앞서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인 고순도 불화수소, 포토 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등 3개 품목에 대해 수출 규제를 진행했다.
또 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며 추가 규제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현재까지 추가 규제 대상으로 반도체용 웨이퍼와 고순도 폴리실리콘 등 반도체 핵심 소재가 언급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 OCI는 기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과 더불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으로 시장 점유를 확대하려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구상 중으로 비쳐진다.
특히 OCI의 고순도 폴리실리콘이 산업계 내에서도 일본 의존도를 낮추고 국산화의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가 나오며 이 분야에 신경을 집중하고 있다.
우선 OCI는 원가경쟁력을 앞세울 수 있는 말레이시아 공장을 통해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국내에서 생산하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은 '고부가'를 강조해 기술 경쟁력을 강조한다는 전략도 내비치고 있어 완벽한 미래전략을 선점한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OCI는 현재 주요 고객사와 관련 소재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중이다.
또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위해 군산공장 일부를 업그레이드도 마쳤다. 실무진 역시 전문가로 꾸렸다.
실제 지난 3월 선임된 김택중 사장은 폴리실리콘 사업본부장 등을 역임한 화학사업 전문가다.
김 사장 선임 당시 이우현 OCI 부회장은 "고부가가치 폴리실리콘 시장인 고순도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사업 확대를 통해 수익성을 개선할 것"이라며 "폴리실리콘 경쟁력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할 방침"이라고 말한 점이 적중한 셈이다.
OCI는 이번 한・일간의 무역 분쟁을 계기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을 자사의 베이직케미컬사업을 다시 끌어올릴 심산이다.
이는 그동안 회사의 캐시카우이던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이 부진의 늪에 빠진데다 반도체 부분 역시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는 판단에 서다.
실제 2017년에만 해도 OCI의 총매출 중 49%를 차지했던 베이직케미컬사업(폴리실리콘 등)은 올 1분기 42%로 하락했다.
반면 반도체용 폴리실리콘의 비중은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OCI는 현재 매출비중 1% 수준인 반도체 폴리실리콘 출하량을 2022년 연간 5000톤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1~2% 내외에 불과한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비중 확대 여부에 따라 OCI의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라며 "진행 중인 테스트가 빠르게 이뤄져 계약 조기 성사로까지 이어진다면 국내 공장 수익성 호전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업계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기술력 강화와 소재 국산화의 속도를 높이려면 정부 지원이 뒷받침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는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시장이 신시장이 아닌 고도의 기술력으로 우위를 점해야 하는 경쟁시장이기 때문이다.
정부의 지원 강화가 반도체용 폴리실리콘 국산화의 시작이 될 날이 머지 않아 보인다.
박남철 기자 pnc4015@daum.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