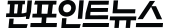전북특별자치도가 단단히 뿔이 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한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1순위 선정에서 탈락하자 “납득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은 물론 법적 대응까지 시사하고 나섰다.
불만의 핵심은 ‘부지 소유권 이전 가능 지역 우선 검토’라는 조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새만금 부지를 국가에 넘기겠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했는데도 왜 떨어졌냐는 항변이다.
하지만 전북의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을 보지 못한 처사로 보인다. 냉정하게 따져보자.
우선 공모 지침의 ‘우선 검토’라는 문구는 ‘자동 선정’이나 ‘절대 기준’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부지 확보의 용이성을 평가하는 항목 중 하나임에도 전북도는 이 조항을 마치 ‘낙찰 보증수표’처럼 해석하고 있는 듯 하다. 하지만 1조 2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가 핵심 연구 시설을 선정할 때 단순히 땅을 쉽게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최종 부지를 결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닐까.
인공태양 연구시설은 부품 조립 공장이 아니다. 초고온·초고압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기술이 집약된 R&D 시설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땅의 넓이’나 ‘소유권 이전 속도’가 아니라, 연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산·학·연 인프라’와 ‘기술 집적도’다.
이번 공모에서 전북과 경쟁한 전남 나주를 보자. 나주는 한국전력공사와 한국에너지공대가 위치한 대한민국 에너지 산업의 심장부다. 핵융합 연구의 핵심인 전력 계통 기술과 고급 인력들이 정주하며 연구할 수 있는 생태계가 이미 조성돼 있다는 평이다. 앞서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에너지 국가산단 등에 연이어 지정된 바도 있다.
심사위원들은 ‘누가 땅을 공짜로 빨리 주는가’가 아니라 ‘어디에 지어야 연구가 성공할 수 있는가’를 봤을 것이다. 지반의 안정성, 교통 접근성,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가능성 등 종합적인 평가에서 전북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이 이번 탈락의 본질로 보인다.
전북도는 2009년 협약 등 ‘16년 간의 신뢰’를 언급하며 억울함을 호소하지만 과거의 약속이 현재의 경쟁력을 담보해주지는 않는다.
탈락은 쓰라리다. 기본 요건과 정책 부합성에서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전북도 입장에서는 특히 말이다. 하지만 승복할 줄 아는 것도 실력이다.
심사 기준의 지엽적인 문구 하나를 붙들고 늘어지기보다, 왜 우리 지역의 연구 생태계가 경쟁 지역보다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뼈아픈 자성부터 하는 것이 순서 아닐까.
빠르게 바뀌는 과학기술 환경 속에서 냉정한 평가가 이뤄진 결과를 두고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려는 태도는 자칫 ‘지역 이기주의’나 ‘행정 발목잡기’로 비칠 수 있다. 국가 백년대계인 과학 기술 인프라 구축이 지자체의 ‘떼쓰기’로 얼룩져선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