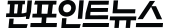PPI 대체 '트렌드 전환' 흐름 본격화
대원·다케다 합류로 지각변동 예고
![(왼쪽부터) HK이노엔 '케이캡', 대웅제약 '펙수클루', 제일약품 '자큐보'. [사진=각사]](https://cdn.pinpointnews.co.kr/news/photo/202511/398831_392870_5034.jpg)
국내 P-CAB(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 시장이 3000억원 규모로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기업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위식도역류질환을 비롯한 소화성 질환 진료가 늘고 기존 PPI(프로톤펌프억제제)의 한계가 부각되면서 P-CAB 중심으로 처방 수요가 빠르게 이동한 영향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시장은 2019년 8000억원에서 2023년 1조2666억 규모로 확대됐다. P-CAB 원외처방액은 2019년 304억원에서 2023년 2172억원, 지난해 2864억원까지 늘었고 올해는 3000억원 안착이 예상된다.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하며 기존 PPI 시장과 동반 확대되는 추세다. 올해 글로벌 P-CAB 시장 규모는 40조원으로 추산된다.
◆ 3강 체제 공고…적응증·제형 확대 전면전
국내 P-CAB 시장의 선두는 HK이노엔 ‘케이캡’이다. 2019년 첫 국산 P-CAB 신약으로 출시된 이후 빠르게 제품력을 인정받으며 지난해 처방액 1969억원을 기록했다. 미란성·비미란성 위식도역류질환(GERD), 위궤양,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 등 총 5개 적응증을 확보해 계열 내 가장 넓은 효능 범위를 갖고 있다. 케이캡은 18개국에서 출시됐고 53개국과 기술·완제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대웅제약 ‘펙수클루’도 성장세가 두드러진다. 지난해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고 최근 NSAIDs 유도성 소화성궤양 예방 적응증을 가진 20mg 제형을 확보해 처방 확대에 탄력이 붙었다. 비미란성 GERD 등 7개 적응증 개발을 진행 중이며 중국 허가 획득으로 해외 확장에도 청신호가 켜진 상태다.
제일약품 자회사 온코닉테라퓨틱스가 개발한 ‘자큐보’는 지난해 출시 후 빠르게 시장에 안착했다. 동아에스티와 공동판매 체계를 구축했고 19개국 대상 기술수출 계약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도 확보했다. 구강붕해정 제형을 더하며 제품 구성도 다변화하고 있다.
◆ 대원제약 'DW4421'·다케다 '보신티' 변수
기존 3강 구도 속에서 대원제약과 다케다제약이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대원제약은 최근 P-CAB 신약 후보 ‘DW4421(파도프라잔)’의 임상 3상 시험계획(IND)을 승인받고 후기 개발 단계에 진입했다. DW4421은 유노비아로부터 기술도입한 물질로, 임상 2상에서 미란성 GERD 환자 대상 시험에서 모든 용량군이 활성대조군보다 높은 완전치유율을 보이며 유효성과 안전성을 확인했다. 현재 미란성·비미란성 GERD 두 적응증 확보를 목표로 임상이 진행 중이다.
여기에 다케다제약 ‘보신티(보노프라잔)’ 국내 출시 가능성이 점쳐지면서 시장 재편 가능성이 커졌다. 다케다는 지난해 약가 협상 난항으로 품목허가를 자진 취하했지만 최근 허가 재신청을 마쳤다. 일본·미국 등 해외에서 이미 안정적인 실적을 내고 있는 만큼, 국내 제약사들 사이에서는 공동판촉 파트너로 참여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국내 P-CAB 시장은 이미 국산 3개 품목이 임상 데이터와 적응증 확장으로 처방 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한 상태여서, 보신티가 진입하더라도 시장 영향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신중론도 나온다. 다만 처방 트렌드 변화와 P-CAB 계열의 빠른 약효·편의성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기존 3강 체제에서 대원제약과 다케다제약까지 포함한 다자 경쟁 구도로 재편되며 시장 전체파이가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P-CAB 시장은 단순한 대체재 경쟁이 아니라 국내 치료 관행 자체가 바뀌는 단계에 진입했다”며 “후발 신약의 등장과 글로벌 제품의 합류 가능성이 겹치면서 내년부터는 질적·양적 변화가 동시에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