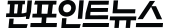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이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반포한 지 579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한글의 완성된 시대’에 살고 있다. 문자 해독률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스마트폰 자판 하나로 언제 어디서든 글을 쓴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토록 글을 많이 쓰는 시대에 ‘바르게 쓰는 법’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다.
요즘의 언어 풍경을 보면 세종이 상상하지 못했을 정도다. “킹받네”, “ㄹㅇㅋㅋ”, “JMT”, “에바야” 같은 표현들이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다. 자음과 모음만으로 감정을 전달하고, 문장 대신 이모티콘으로 대화한다. 언어는 짧아졌지만 속도는 빨라졌다. 편리함이 사고를 대신하고, 표현의 간소화가 사고의 단순화를 부른다.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의 수단이 아니다.
우리가 세상을 인식하고 사고를 정리하는 도구다. 그래서 언어의 변화는 곧 사고의 변화다. 문장이 짧아지고, 단어가 단순해질수록 생각도 얕아진다.
‘말’의 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은 결국 ‘사람’의 생각이 가벼워지는 일과 다르지 않다.
그렇다고 변화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언어는 늘 시대를 반영해 왔다. 세종이 한글을 만든 것도 그 시대의 언어가 지배층의 전유물이었기 때문이다. 백성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표현하게 하려는 ‘소통의 혁명’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줄임말 문화’나 ‘디지털 은어’도 새로운 시대의 소통 방식일 수 있다.
문제는 그 변화의 방향이다.
소통을 넓히는 언어가 아니라, 의미를 축소시키는 언어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
예컨대 ‘고맙습니다’라는 말이 ‘ㄱㅅ’으로 줄어드는 순간, 감정의 온도는 반으로 식는다. ‘괜찮아요’ 대신 ‘ㅇㅋ’으로 대답하면, 대화는 끝나지만 관계는 남지 않는다. 한글의 강점은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 ‘정서적 깊이’에 있다. 소리와 의미가 맞닿는 구조 덕분에, 한글은 그 어떤 문자보다 감정을 섬세하게 전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능성을 스스로 좁히고 있다.
SNS 시대의 언어는 빠르고 자극적이다.
긴 문장은 피곤하고, 논리보다는 밈(meme)이 통한다. “문법 따지는 건 꼰대 같다”는 분위기도 있다. 그러나 언어의 품격은 생각의 품격을 지탱하는 최소한의 질서다.
맞춤법은 단지 문법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공동체의 약속이다. 대충 써도 ‘뜻만 통하면 된다’는 말은, 결국 ‘서로의 이해를 포기하겠다’는 선언과 다를 바 없다.
한글의 본질은 단순함에만 있지 않다. 그 단순함 속에 복잡한 생각과 미묘한 감정을 담아낼 수 있다는 점이야말로, 세계 어디에도 없는 한글의 과학성과 예술성이다.
자음과 모음의 결합으로 무한한 조합이 가능하듯, 우리의 말도 무한한 감정과 사유를 표현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가능성을 ‘생략’이라는 이름으로 잘라내고 있다.
언어의 변화는 불가피하지만, 그 방향은 우리가 정할 수 있다.
한글날은 단지 세종의 업적을 기리는 날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언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날이다.
스마트폰 자판에 익숙한 손가락을 잠시 멈추고, 한 문장을 온전히 써 내려가 보자. ‘ㅋㅋ’ 대신 웃음의 이유를 적고, ‘ㅎㄷㄷ’ 대신 놀란 마음을 풀어 쓴다면, 그 문장 안에는 더 많은 나와 더 깊은 생각이 담길 것이다.
세종이 훈민정음을 만든 이유는 백성으로 하여금 스스로 배우고 생각하게 하려는 것이었다.
즉, 한글은 ‘생각하는 힘’을 주기 위한 문자였다. 그런데 지금의 언어 문화는 생각을 단축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면, 우리는 세종의 뜻에서 멀어지고 있는 셈이다.
언어는 곧 사회의 수준을 비춘다. 대화의 품격이 떨어질수록 공동체의 신뢰는 흔들린다. 그래서 한글날은 과거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미래의 대화법을 설계하는 날이어야 한다.
‘말을 바로 세운다’는 건 고리타분한 일이 아니다. 그건 서로의 생각을 존중하고, 다름을 이해하고, 오해를 줄이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다.
세종대왕이 오늘의 대한민국을 본다면 아마도 놀라면서도 뿌듯해하실 것이다. 그가 만든 문자가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창의적인 문자로 자리 잡았으니 말이다.
하지만 동시에, 세종은 이렇게 물을지도 모른다.
“너희는 그 글자로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한글날은 바로 그 질문에 답하는 날이다.
우리가 한글을 얼마나 ‘잘 쓰는가’보다, 얼마나 ‘깊이 있게 말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는 시간.
그때 비로소 한글은 다시 살아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