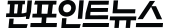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카카오톡은 유료화할 계획이 전혀 없다.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고, 쿨하지도 않고, 예쁘지도 않다."
2010년 출시 당시 카카오가 남긴 이 약속이 지금 다시 화제가 되고 있다. 15년간 단순함과 편리함으로 승부해온 메신저가 갑작스럽게 SNS로 변신을 시도하면서다. 앱스토어 평점은 2.5점까지 추락했고, 리뷰란에는 분노한 이용자들의 "역대 최악 업데이트"라는 혹평이 끝없이 쏟아진다.
카카오는 왜 이런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변화를 밀어붙였을까. 답은 체류 시간과 수익 모델이다. 카카오톡의 월간 사용자 수(MAU)는 4819만명으로 국내 SNS 중 압도적 1위다. 그러나 1인당 월 평균 이용 시간은 11시간 25분으로, X(14시간 58분)는 물론 다른 경쟁 SNS보다도 짧다. '많이 쓰지만 오래 머물지 않는' 메신저의 태생적 특성이 광고 수익화의 발목을 잡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카카오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메신저에서 SNS로 탈바꿈해 체류 시간을 늘리고, 그 시간을 광고 수익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방식이었다. 연락처·프로필을 확인하던 ‘친구’ 탭을 인스타그램식 타임라인으로 바꾸면서, 원치 않는 타인의 일상이 기본값으로 눈앞에 펼쳐졌다. 여기에 숏폼 콘텐츠까지 끼어들어 피로감이 가중됐고, 프로필과 동일한 크기의 광고까지 더해지면서 이용자 반발은 눈덩이처럼 커졌다.
이 불편은 곧장 생활 전반으로 번졌다. 직장인은 “상사 일상을 왜 강제로 봐야 하느냐”고 토로하고, 부모들은 “아이들 숏폼 노출을 막아왔는데 카톡에까지 들어오니 답답하다”고 말한다. 특히 학교 공지, 학부모 소통, 지역 커뮤니티 등 일상의 소통 대부분이 카톡 단체방을 통해 이뤄지는 현실에서 앱을 삭제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용자들은 원치 않는 변화를 선택권 없이 떠안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카카오톡은 연락·업무·모임까지 모든 관계를 엮어주는 ‘기본 메신저’로 자리 잡았다. 누군가의 연락처만 알면 바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는 단순함이 가장 큰 장점이었지만, 이번 개편은 그 단순함을 깨부쉈다. 원치 않는 피드와 광고가 끼어들게 되면서 이용자들은 ‘편리한 메신저’가 아닌 ‘부담스러운 SNS’를 마주하게 됐다.
카카오의 대응도 아쉬움을 남겼다. 일례로 공식 유튜브에 올라온 개편 소개 영상은 댓글 창이 닫혔다. ‘이용자 목소리를 듣겠다’던 회사가 정작 가장 직설적인 피드백이 모이는 공간을 차단한 셈이다.
이후 카카오는 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친구탭 첫 화면을 다시 ‘친구목록’으로 되돌리고, 피드형 게시물은 별도 메뉴로 분리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3일 개발자 콘퍼런스에서 대대적 개편안을 발표한 지 정확히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다.
하지만 실제 적용은 올해 4분기 이후로 예정돼 있어 이용자 불편은 당분간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일각에서는 피드형 화면이 광고 노출 창구로 활용돼 온 만큼, 이미 체결된 계약 탓에 롤백(이전 버전 복원)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된다.
물론 기업 입장에서 수익 창출은 중요하다. 하지만 사용자를 외면한 일방적 변화는 위험하다. 아무리 압도적인 사용자 수를 보유해도 신뢰를 잃으면 언제든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다.
카카오톡이 선택한 SNS로의 길이 새로운 기회가 될지, 아니면 15년간 쌓아온 신뢰를 무너뜨리는 결정적 실수가 될지 지켜볼 일이다. 분명한 건 이용자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