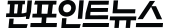부가세 10% 소비자에 전가…고정사업장 없어 매출 ‘모르쇠’ 해결방법 미지수

글로벌 IT 업계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구글세, 즉 디지털세를 도입했으나 결국 세금은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갈 예정이다.
디지털 서비스세는 과세 방법이 부가세와 법인세 두가지로 나뉜다. 전문가들은 이중애서도 글로벌 IT기업을 완전하게 규제하려면, 법인세 도입이 필수라는 입장이다. 소비자에게 전가되지 않는 순수 매출액에 대한 부담금이기 때문이다.
반면, 당국은 현행법상 글로벌 IT기업은 고정 사업장이 없어 법인세 부과가 어렵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대신 부가가치세를 도입했으나 이 역시 유통과정을 포함한 세금으로 거래 과정 중 소비자에게 얼마든지 세금이 전가될 수 있다.
조세업계 등 전문가들은 글로벌 IT 기업 규제를 강화하려다 오히려 소비자만 비용 부담을 덮어쓴 꼴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는 IT업계를 막으려면 고정사업 유치를 유도해서라도 법인세 도입을 촉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디지털세 해법에 대해 조세업계 전문가들은 어떤 생각일까?
한 조세전문가는 “디지털 서비스세는 과세방법이 부가세와 법인세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이 중 정부는 부가세만 도입해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부가가치세는 유통 과정을 포함한 세금으로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며 “부가가치세는 결국 유통의 마지막 단계인 소비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크다”고 언급했다.
실제로 구글 측은 7월 1일부터 제품군에 상관없이 모든 품목에 10%의 부가세를 추가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따라서 개인 소비자는 기존 가격보다 10%를 더 내야한다.
그렇다면구글에게 제대로 ‘디지털세’를 물리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조세업계 전문가는 소비자가 아닌 구글에 ‘디지털세’를 제대로 물리려면 법인세를 도입해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인세는 법인의 소득에 직접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으로 유통 과정을 배제하고 순수하게 회사의 순매출에 부담한다”며 “구글세에 법인세를 포함해야 해외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소비자는 비용 부담을 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구글과 같은 글로벌 IT 기업에게 법인세를 도입할 명목이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현행 법인세법은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에만 세금을 부과하는데, 구글코리아는 싱가포르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 과세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대답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의 대부분을 싱가포르 기록해 조세를 회피하고 있다. 지불한 세금은 매출 규모가 비슷한 네이버 측의 20분의 1에 불과하다.
현재로서는 법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궁금했다. 그래서 IT업계에게 해결책을 찾아봤다.
IT업계 측은 구글에서 법인세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설치토록 유도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 IT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규제를 도입하면 세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며 “클라우드 서비스에서는 이미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두도록 유도하는 조치가 시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월 공공기관이나 금융회사가 구글 등 IT 기업들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반드시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둬야 한다는 규제를 도입했다. 이에 구글 측이 구글이 법인세를 내기로 한 것이다.
혹은 세법을 개정해 고정사업장 개념을 좀 더 확장해야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현행 세법에서 IT 서비스에 대해서는 서버의 위치를 기준으로 고정사업장을 판단하는데 서버의 위치뿐 아니라 한국어 홈페이지 등을 개설해 고정사업장을 국내에 둔 것으로 판단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차혜린 기자 chadori95@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