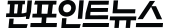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핀포인트뉴스=홍미경 기자] 미세먼지가 극심해지면서 환경오염은 심각해지고 물은 부족해지고 있다. 물은 현대인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관심사다. 돈 주고 물을 사먹는걸 당연히 하는 시대가 됐다.
보통 가정이나 식당에서는 정수기 물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생수를 일일이 주문해서 도착을 기다리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 편하고 값싼 편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정수기 물이 어떤 상태의 물인지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정수기 물을 마시면서도 항상 찝찝한 느낌이 가시는 않는 이유이다.
이시점에 물맛의 기준이 궁금해진다. 관연 물맛의 기준을 정립한다는 것이 가능할까?
그 해답을 알려주겠다는 곳이 나왔다. 바로 코웨이 '물맛 연구소'다. 코웨이는 연구소 오픈에 앞서 물맛 연구소는 깨끗하고 맛있는 물에 대해 연구하고, 정수기 물맛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맛있는 물의 기준은 매우 주관적이다.
유럽인들은 물속에 미네랄이 많이 든 센물을 선호하는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적게 든 연수를 선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수자원공사가 실시한 블라인드(어떤 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맛을 평가하는) 설문조사에서 참가자의 46%가 수돗물을 가장 맛있는 물로 골랐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 먹는샘물 23%, 국외 먹는샘물 17%, 정수기물 14%의 순이었다.
정수기 물이 비호감군에 속하게 되면서 코웨이는 2009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물맛 연구를 시작했다. 2011년 물맛의 방향성을 잡고 2017년 자체 물맛 기준인 'GPT(Good Pure Tasty water) 지수'를 수립해 제품 평가에 활용하고 있다. 2019년 비로소 물맛 연구소를 설립했다.
최초 조직된 TF팀이 2009년 시작해 거의 10년 만에 물맛의 방향을 잡고 자체 물맛의 기준을 잡는 수치를 잡았다는 것이다. 이는 물맛의 기준이라는 것을 잡는다는 것이 얼마나 추상적인 일인지를 알려주는 단면이다.
사실 제품을 판매하는 업체에서는 아주 작은 포인트 하나만 달라져도 다른 제품들과 차별화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크게 홍보하는 것이 관례다.
하지만 물이 과연 정수기 필터에 의해 달라질 수 있는 맛일까라는 의문을 품지 않을 수 없다.
반도체로 따지면 10년이라는 개발 역사는 100배 이상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이다. 전문가들은 '물맛'이라는 주관적인 관념을 객관화하고자 하니 오랜 시간을 소요할 수밖에 없었지 않았냐고 입을 모았다.
물맛연구소에서는 정수기 물맛의 속성 정의, 필터 성능에 따른 물맛 연관성 입증, 기준 등을 연구한뒤 정수기, 필터 개발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결국 정수기에 들어가는 필터를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목적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10년의 시간 동안 연구한 자료는 정수기 필터 생산을 위함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근 물 소비 트렌드는 '생수'다. 프리미엄 생수가 등장할 정도로 사람들은 깨끗하고 청정한 물에 대해 열광한다. 특히 청정한 지역에서 가져온 물에 대한 신뢰는 매우 두텁다.
청정한 물의 항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칼슘과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다. 예로부터 소문난 약수에는 미네랄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 미네랄을 논할 때 정수기물은 명함을 내밀기 어렵다. 대부분의 정수기 업체가 사용하는 역삼투압 방식은 미네랄을 모두 걸러내 증류수라는 얘기까지 듣는다.
결국 코웨이 '물맛연구소'는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 마치 물맛을 연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동안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고 자인한 꼴이다.
그 배경에는 이미 정수기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고, 그 위기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아니냐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