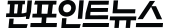제네릭 공화국. 국내 제약시장을 일컫는 말이다. 숱하게 많은 제네릭이 허가되고, 또 사라진다. 문제는 이 구조가 경쟁과 효율을 낳지 못한 채 불신과 낭비만 남겼다는 데 있다.
최근 정기석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발언은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는 성분명 처방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제네릭 간 효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견해를 덧붙였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정부조차 제네릭을 믿지 않는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제네릭 대체조제를 장려하는 정부가, 동시에 효능 차이를 이유로 성분명 처방을 주저하는 모습은 자기모순에 가깝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규제도 제네릭 시장의 신뢰를 갉아먹었다. 발사르탄 사태 이후 난립을 막겠다며 약가제도를 손질했지만 그 과정에서 기업들은 제도 시행 전 '묻지마식 허가'에 몰렸다. 이후 시장에서 팔리지도 못한 제네릭이 수천 품목씩 급여목록에서 삭제됐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오히려 '허가→퇴출' 수순의 악순환을 낳은 셈이다.
결국 책임은 시장에 남았다. 생산 실적이 없어 급여에서 빠진 약만 지난해 1000여 개, 이 중 절반 이상이 출시 5년도 안 된 제품이었다. 팔리지도 않는 약을 유지하느라 투입된 행정비용과 건강보험 재정은 고스란히 사회적 낭비로 귀결됐다.
제네릭 약가 또한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국내 제네릭은 오리지널 대비 53% 수준에서 책정되지만, 유럽 주요국은 20~30% 선이다. 약효 불신은 커지고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싼 것도, 믿을 만한 것도 아닌' 제네릭이 되어버렸다.
정부는 또다시 제네릭 약가 인하를 위한 새로운 제도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정책의 방향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 회복이다. 제네릭이 오리지널과 동등하다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품질 관리와 생동성평가 체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규제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기업은 그 틀 안에서 경쟁해야 한다.
제네릭은 본래 의료비 절감과 접근성 향상을 위한 제도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불신과 혼선 속에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고 있다. 제네릭 공화국이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으려면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규제가 아니라 신뢰를 회복하는 정책의 일관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