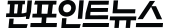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은 돈과 계약, 자비를 둘러싼 재판극이다.
상인 안토니오는 친구의 구혼을 돕기 위해 유대인 고리대금업자 샤일록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면 살 1파운드를 내주겠다는 조항에 서명한다.
배가 침몰해 빚을 갚지 못하자 샤일록은 계약대로 살을 요구하며 법정에 선다. 그러나 법정은 계약보다 자비를 택했다.
판사로 변장한 포샤는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만 베라”는 논리로 샤일록의 요구를 무력화시켰다. 정의는 세워졌지만 계약의 신뢰는 무너졌다.
400년 전 이야기지만, 도덕의 잣대가 법의 결론을 흔드는 장면은 지금의 한국 사회에서도 반복된다.
최근 삼성생명 즉시연금 대법원 판결 이후 금융당국의 대응이 그랬다.
대법원은 보험사가 연금 산출 구조를 명확히 설명하지 않은 점을 들어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지만, 계약 전체를 무효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부 가입자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를 남긴 것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근거로 “판결 이후 시장 혼선 여부를 점검하겠다”며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법이 결론을 내렸지만, 행정은 여전히 포샤처럼 ‘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살만 베라’는 식의 해석을 이어가고 있다.
그럴 때마다 ‘불완전판매’는 어김없이 등장해 판을 다시 뒤흔든다.
투자 손실이 나면 판매사가, 약관이 불명확하면 금융회사가, 이해가 안 됐으면 설명 의무가 부족했다고 한다.
결론은 늘 같다. “원금을 돌려줘라” 소비자 보호의 이름으로 계약이 뒤집히고, 책임의 균형이 무너진다.
비슷한 사례는 적지 않다. 키코 사태가 대표적이다.
2005년부터 수출기업들이 가입한 환헤지 상품은 2008년 금융위기 때 환율 급등으로 2조5000억원대 손실을 냈다.
피해 기업들은 불완전판매를 주장했지만, 2013년 대법원은 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019년 금융당국은 일부 배상을 권고했고 사회적으로는 여전히 ‘기업 피해’로 남았다.
홍콩 H지수 연계 ELS 사태도 마찬가지다.
2024년 상반기에만 10조원이 만기 도래하며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고, 금융당국은 불완전판매를 인정해 투자자별 손실의 최대 65% 배상을 권고했다.
판결이 끝나도 논의는 끝나지 않는, 한국 금융시장의 익숙한 패턴이다. 이번 즉시연금도 같은 길을 걷지 않으리란 보장은 없다.
사람들은 말한다. “그래도 은행이나 보험사는 돈 많잖아. 좀 돌려주면 어때.”
이런 사례가 반복될 수록 시장은 조용히 변한다. 금융사는 불확실한 상품을 접고, 위험이 있지만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상품을 줄인다. 대신 안전하지만 이율이 낮은 상품만 남는다. 선택지가 줄어드는 것이다.
또 금융사가 손실 배상에 쓴 비용은 결국 보험료와 수수료로 되돌아와 소비자가 나눠 낼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판결과 행정 개입이 반복되면, 해외 자본은 ‘계약이 무의미한 시장’이라며 빠져나간다.
감정의 정의는 잠시 통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대가로 잃게 되는 것은 시장의 신뢰다.
결국 피해자는 ‘돈 많은 금융사’가 아니라, 그 시스템을 믿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