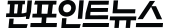사상 최대 실적 금융권 '정조준'
이자장사 프레임 씌우고 상생금융 청구
진정한 상생은 사전 협의가 우선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툭하면 사상 최대 실적을 빌미로 금융권을 겨냥한 청구서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는 '상생금융'이라고 쓰지만 금융권은 '청구서'라고 읽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금융당국이 벌어들인 수익은 사회적 약자 등을 위해 쓰이는 공공성을 띠기도 한다. 특히 서민금융안정기금, 배드뱅크 설립, 교육세 인상, 국민성장펀드 출연, 소상공인 채무 감면 등 공공성이라는 명분은 있지만, 정치적 의미도 담겨져 보인다.
대표적인 것이 대통령의 '이자장사', '잔인한 금융' 등의 발언이다. 은행이 지나치게 많은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은 단골 소재가 된 지 오래다. 문제는 이 발언 이후 등장하는 정책의 흐름이다. 대통령의 언급은 여론을 형성하고, 여론은 압박이 되고, 압박은 곧 실질적 재정 기여로 이어진다.
정책 방향에 이견을 제기하는 금융권은 많지 않다. 역대급 실적을 낸 은행들이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건 당연하다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상생금융 청구서'에 대한 불만은 그 내용보다 방식에 집중돼 있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진정한 상생이라면 협의와 조율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요즘은 프레임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엔 조 단위 부담이 따라온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관치는 경계하면서, 정치 개입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들인다"며 "이쯤 되면 정금분리도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에서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감독 독립성’이라는 명분과 달리, 정치가 금융정책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넓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삼성증권에 따르면, 교육세 인상·배드뱅크 출연·각종 과징금 등으로 4대 금융지주의 연간 순이익이 최대 4조 5664억원 감소할 수 있다. 이는 전체 순이익의 최대 18% 수준이다. 여기에 국민성장펀드 150조 조성에 따른 추가 부담까지 더해질 경우, 수익성 타격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상생은 일방적으로 강요되어선 안 된다. 자칫하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이 아니라, 정치적 메시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을 위한 금융정책이라면, 납득 가능한 방식과 언어로 설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