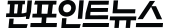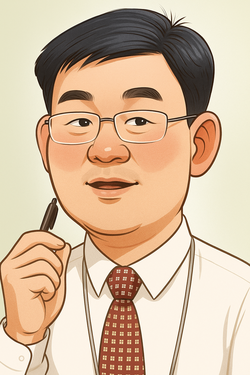
이재명 정부가 첫 부동산 대책(6.27 대출 규제)을 발표한 지 한 달 가까이 지났다. 충격파는 아직도 가시지 않고 있다. 발표 다음날 곧바로 대책이 시행된 데다 규제 대상도 주택담보·전세·이주비 등 대출 분야를 총망라한 탓이다.
6.27 대출 규제는 ‘돈줄’을 끊는 데 초첨을 뒀다. 서울·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3구·용산구)에서 집을 살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묶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입주하도록 했다. ‘영끌’과 ‘갭투자’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취지다.
문재인 정부 때 집값이 15억원을 넘을 경우 주담대를 전면 금지(2019년 12.16 부동산 대책)한 적이 있긴 하지만 집값이나 소득 수준을 가리지 않고 주담대 한도를, 그것도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건 초유의 이다. 그만큼 역대급 최강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다. 대출을 틀어막아 강남발 아파트값 급등세를 막겠다는 심산이다.
규제 약발은 일단 먹혀들고 있는 듯하다. 대책 발표 전까지 펄펄 끓던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섰고, 가격도 상승세가 한풀 꺾인 상태다. 하지만 실수요자 피해가 만만찮아 후폭풍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모양새다.
입주를 앞두고 잔금 대출을 계획했던 분양 계약자들은 한순간에 자금 조달 계획이 틀어지면서 계약금을 날릴 위험에 처했고, 가계약만 체결한 이들은 대출 한도 축소로 계약을 포기하거나 위약금 부담까지 떠안게 됐다. 재건축·재개발 이주비 대출 역시 규제 대상이 되면서 조합들은 대체 자금 조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소득 수준에 맞춰 대출 한도를 정하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염두에 두고 자금 조달 계획을 짰던 실수요자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라”던 DSR 기조는 금융당국이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원칙이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하루아침에 무력화됐다. 정권이 바뀌자마자 기존 원칙이 한방에 무너졌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대출 규제는 맛보기에 불과하다”며 “더 강한 카드가 남아 있다”고 했다. 집값이 진정되지 않으면 대출 규제보다 더 강력한 수요 억제책을 내놓겠다는 경고다.
정부가 금융(대출 규제)·세제(과세) 강화를 통해 집값 안정을 꾀하겠다는 취지는 이해할 수 있다. 투기 수요를 눌러 부동산 시장에 과도하게 몰린 자금을 산업이나 금융시장으로 흘러들게 하는 일은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수요 억제에만 기댄 땜질식 대책은 집값을 잠시 눌러놓는 역할을 할 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근본적 해법은 될 수 없다. 규제만으로는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힘들다는 얘기다.
실제로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한강 벨트지역 일부 단지에선 대출 규제에도 신고가 거래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집값은 억지로 누른다고 잡히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가 반면교사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만큼은 자신 있다”고 큰소리치면서 28차례에 걸쳐 규제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집값을 잡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시중 여윳돈이 다른 곳으로 흘러가게 길을 터주고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 된다.
더욱이 인구와 일자리가 몰려 있는 서울·수도권에는 주택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수요를 억누른다고 해서 수요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는다. 공급 확대 없이는 집값 안정도, 민심 안정도 기대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건 '맛보기'가 아니라 수요에 맞는 충분한 주택 공급이다.